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몸은 갇혀도 정신은 자유롭다"
- 독서/북리뷰.서평.
- 2019. 7. 9. 2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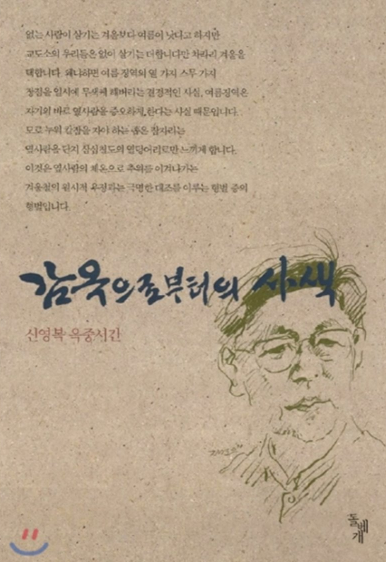
자유의 진정한 의미
`자유`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물질적/신체적 자유가 아닌, 정신적 자유로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영복 교수의 옥중서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좁디좁은 한정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얼마만큼이나 정신적 활동을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지 압도적인 사유의 결과물 앞에 읽는 내내 숙연함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인간의 신체활동을 구속하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 중의 형벌로 판단하여 옥살이를 창조해낸 최초의 입법자는 신영복 교수의 저서를 읽으면 아마도 자신의 생각이 오판이었음을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누구나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생김새가 다른만큼 생각이 다르고 행동 또한 다르다. 때문에 어찌 보면 사유의 진정한 의미는 다름을 포착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의 활동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게을리하거나 멈추는 순간, 개인의 자유로운 신체는 의미를 잃은 채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림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단정함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아닌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생명력이 넘실거리는 문장들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수감생활은 더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환경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변화란 단어는 사치일 뿐이다. 그렇지만 신영복 교수의 옥 생활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통찰한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정신적 자유로움의 변화이며 나머지 하나는 계절과 자연에 대한 다채로움이다. 20년의 편지 속에 자연과 계절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삶의 의미를 고찰해낸다. 글로써 압축되는 그의 필력은 직접 읽어보지 않고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그만의 멋짐이 묻어있다.
"겨울의 싸늘한 냉기 속에서 나는 나의 숨결로 나를 데우며 봄을 기다린다."처럼 불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바닥에서 따스한 감정을 지켜낸 저자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기도 하고, "모기망에 갈갈이 찢어져 국수가닥이 된 새벽 바람이..." 처럼 바람이 찢어져 들이닥치는 시각화된 재미도 느껴진다. 그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생명력으로 넘실거린다. 적절한 생활온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방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하기만 한 그의 모습은 개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책을 읽음과 동시에 나를 읽는 것
"더러 험한 일을 하기도 하는 징역살이가 조금씩 새로운 나를 개발해줄 때 나는 발밑에 두꺼운 땅을 느끼듯 든든한 마음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언제인가 내가 서있는 땅의 두께로 인해 든든하다고 느껴본적이 있던가? 다만 가슴에 품고 있는 지갑의 두께를 한탄했던 적은 많았다. 개인의 행복은 주변의 풍요로움을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는 발견의 능력으로 수렴된다면 앙드레 지드처럼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능력은 더 이상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의 깊이는 대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 하나만을 간직해도 풍부한 독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력을 겸비한 밴드도 이글스의 명곡 `호텔캘리포니아`를 연주하기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살려서 소화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함부로 시도되거나 연주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자칫 위대한 도전이 경거망동으로 끝나기 때문일 것이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 서평 쓰는 것 역시, 나에겐 호텔 캘리포니아를 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책의 가치적 판단을 떠나 객관적 텍스트로 목적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 서평이 자칫 해를 가리키기는커녕 손가락, 아니 발가락만 보여주는 꼴이 될 것 같아서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절실히 와 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100년 후에도 읽힐만한 고전이 될 것임에 스스로 확신하는 바이다. 나의 보잘것없는 서평에도 일독을 권해본다.
'독서 > 북리뷰.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위로에서 끝나버린 아쉬움" (0) | 2019.07.10 |
|---|---|
| 최진석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 "철학, 어렵지 않아요" (1) | 2019.07.10 |
| 포브스 야요이의 <빵을 끊어라> "모든 병의 근원, 밀가루? 글루텐!" (0) | 2019.07.08 |
| 원종우의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유럽편> "재밌다. 유익하다" (0) | 2019.07.07 |
| 강유원의 <숨은 신을 찾아서> "예수 믿고 천국가는 것이 기독교?!" (0) | 2019.07.07 |








